제임스 본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나이다. 이언 플레밍 원작에도 제임스 본드의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본드의 나이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인 건 아니다. 플레밍의 소설을 읽다보면 본드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힌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임스 본드의 나이를 헷갈리게 만든 건 이언 플레밍의 소설이 아닌 영화 시리즈다.
그래서 6명의 제임스 본드들의 나이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실버스크린 버전 제임스 본드는 숀 코네리(Sean Connery)다.
첫 번째 실버스크린 버전 제임스 본드는 숀 코네리(Sean Connery)다.
1930년 8월25일생인 숀 코네리의 첫 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는 1962년작 '닥터노(Dr. No)'. 촬영 당시엔 만으로 31세였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본드, 제임스 본드'라고 할 때 숀 코네리는 만으로 31세였던 것이다.
그런데, '닥터노'가 1962년 영화인데다 숀 코네리가 지금 70대다보니 그가 제임스 본드가 됐을 때 겨우 30대 초반이었다는 걸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 숀 코네리도 30대 초반일 때가 있었단 말이다!
숀 코네리가 31세였다는 게 의외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제임스 본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보여야 어울리는 것 같은데 31세는 너무 젊은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언 플레밍 원작에서 제임스 본드가 30대로 돼있으니 31세의 코네리가 제임스 본드를 맡기에 너무 젊었던 것은 아니다.
'닥터노'에서의 제임스 본드는 사실적인 캐릭터였다. 맞으면 멍이 들고 피를 흘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후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connery-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5O9jtjq0uzvVpN8H1Ug6RfCbouGCUxrf10a5f9hCdaBvskj_icdgc46fbySSt_hUPBjgE1rP9bd-j6y-ACRauZXoYafOJk-wYcN7CLFqqUxOTbHoGZcxLMwe1Ccwjov3aQRuDLtTGhCM/s1600/connery-2.jpg)
숀 코네리의 베스트 007 영화는 누가 뭐래도 '위기일발(From Russia With Love/1963)'이다. 30대 초반이던 코네리는 '위기일발'에서도 상당히 거친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다. 요새 영화와 비교하면 별 것 아니지만 본드와 레드 그랜트와의 격투는 '숀 코네리 버전 제임스 본드'를 대표하는 씬 중 하나로 꼽힌다.
![[connery-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G-1TdA5Ro_IPkAxmhPVKOYE7NzLvjIEXTOhVAtZ-XmmEe8aPxqWVqr7L93i22cQhaBacEJC08_qDkUMl9KX-eXFLfVhhlQg7MDkxyC7mcKCtv829yx_8PTnig_jdAHT2aL-rhUsFAKBQ/s1600/connery-3.jpg)
이 장면이 유명해진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나온 007 시리즈에서 저 정도 강도의 격투씬을 보기 힘들어진 덕분이다.
좀 한심한 얘기지만 사실이다. 좋게 표현해서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 특수장비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제임스 본드는 주먹싸움 보다는 '악세사리'에 의존하는 쪽이 됐다. 가면 갈수록 제임스 본드는 본드카, 가젯(Gadget) 같은 것에 의존하면서 터프한 맛을 잃어갔다.
 거진 공상과학 영화 수준까지 갔던 '두번 산다(You Only Live Twice/1967)'를 끝으로 숀 코네리는 007 시리즈를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죠지 레젠비(George Lazenby)가 '살인면허'를 넘겨받았다.
거진 공상과학 영화 수준까지 갔던 '두번 산다(You Only Live Twice/1967)'를 끝으로 숀 코네리는 007 시리즈를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죠지 레젠비(George Lazenby)가 '살인면허'를 넘겨받았다.
죠지 레젠비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드영화는 1969년작 '여왕폐하의 007(On Her Majesty's Secret Service)'.
레젠비가 1939년 9월5일생이니 '여왕폐하의 007'을 촬영할 당시엔 만으로 29세였다. 영화가 1969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했으니 레젠비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겨우 서른이었던 셈이다.
29세의 레젠비가 출연한 '여왕폐하의 007'은 다시 원작 스타일로 돌아간 영화다. 일본의 화산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심하게 나갔던 007 시리즈가 본래의 제임스 본드로 되돌아온 것이다.
조지 레젠비 버전 제임스 본드는 초창기 코네리 영화처럼 사실적인 제임스 본드다.'여왕폐하의 007'엔 가젯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 본드가 끄는 자동차도 그저 평범한 자동차일 뿐이고 본드가 가진 거라곤 권총밖에 없다. 그런데, 인상이 코네리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인지 피지컬(Physical)한 본드로 기억되진 않는다.
![[laz-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6vMPJr2y7PzRXGbomEaCyF6zBYtrLSvKs0gvFa-Rnbj1SYYW_2fX3jeIYUF2SB9U8HtiClv4vXLq8u1Def-GX5XHoWijMt2qGrE7OjFH_wXwpIonqyMTx_I77pirOys3UduhkiyXRb_Y/s1600/laz-2.jpg)
하지만, 터프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왕폐하의 007'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임스 본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레이보이로만 나왔던 제임스 본드가 '여왕폐하의 007'에선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다.
![[laz-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KJG9ao4p92dpGV_xa0AN6sB8WfBoCFk8KqqsPdDJ-cMj4L03L-VyIZo8Dv71_M37SwiY-E-4wmiM-CWIkWrUrUex-O38_C4X3UVHF2pUl-r9bqEdYPTXgMwsUxZ1l0qaHVikH5URi5xQ/s1600/laz-3.jpg)
이런 게 바로 원작에 충실한 영화의 매력이다. 원작에서 몇 가지만 빌려갔을 뿐 나머지는 마음대로 만든 영화들에선 맛 볼 수 없는 것이다.
죠지 레젠비는 '여왕폐하의 007' 하나를 끝으로 살인면허를 반납한다. 숀 코네리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1971)'에서 제임스 본드로 다시 돌아오지만 코네리도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영원히' 떠난다(오피셜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는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1983)은 제외).
 세 번째로 제임스 본드가 된 배우는 로저 무어(Roger Moore). 제임스 본드 원작가 이언 플레밍이 제임스 본드로 원했던 배우이기도 하다. 그러니 로저 무어가 제임스 본드가 된 게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었다.
세 번째로 제임스 본드가 된 배우는 로저 무어(Roger Moore). 제임스 본드 원작가 이언 플레밍이 제임스 본드로 원했던 배우이기도 하다. 그러니 로저 무어가 제임스 본드가 된 게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로저 무어가 1927년 10월14일생이란 것이 문제다. 숀 코네리보다도 나이가 위인 로저 무어가 만 45세에 년 영화 '죽느냐 사느냐 (Live and Let Die)'에서 제임스 본드가 됐기 때문이다.
45세의 제임스 본드라고?
이언 플레밍의 소설에 의하면 제임스 본드와 같은 'Double-0(00) 에이전트'는 45세까지다.
소설 '문레이커'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기겠다:
On these things he spent all his money and it was his ambition to have as little as possible in his banking account when he was killed, as, when he was depressed he knew he would be, before the statutory age of forty five.
Eight years to go before he was automatically taken off the 00 list and given a staff job at Headquarters. At least eight tough assignments. Probably sixteen. Perhaps twenty-four. Too many.
간단히 말하자면, 00 에이전트는 45세까지가 전부고, 45세가 넘으면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8년 남았다고 했다. 그러니, 소설 '문레이커'에서의 제임스 본드 나이는 '45 빼기 8'이란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37세란 것이다. 그런데, 로저 무어는 만 45세에 007이 됐다. 이언 플레밍의 소설대로라면 로저 무어는 사무직으로 옮기기 일보직전인 나이에 00 에이전트가 된 것이다.
제임스 본드가 '중년의 사나이'가 된 건 로저 무어부터다. 제임스 본드는 나이가 들어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저 무어의 본드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로저 무어는 물론 제임스 본드에 잘 어울리는 배우였다. 하지만, 007 시리즈가 10년이 흘렀는데 초대 제임스 본드, 숀 코네리보다 나이가 많은 배우를 캐스팅 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한 배우가 계속 출연하면서 시리즈와 함께 늙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새로운 배우로 교체하는데 나이가 많은 배우를 택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로저 무어를 놓치기 아까웠다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임스 본드의 나이가 계속 불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로저 무어란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난 로저 무어를 아주 좋아한다. 로저 무어의 제임스 본드 영화들도 좋아한다. 하지만, 로저 무어와 함께 007 시리즈가 약간 이상해진 것은 사실 아니냐는 게 전부다.
로저 무어는 '주먹 사용을 꺼리지 않는 젊은 에이전트'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해결되는 중년 에이전트'로 제임스 본드를 변화시켰다. '위기일발'에서 본드와 레드 그랜트의 격투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로저 무어 버전 제임스 본드가 주먹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코네리 시절처럼 죽기살기로 격렬하게 치고받는 맛이 없다. 로저 무어의 본드영화 자체가 워낙 가벼워진 덕분이다.
무어의 본드영화가 변한 건 1981년 '유어 아이스 온리(For Your Eyes Only)'부터. 우주까지 나갔다 온 제임스 본드를 원상복귀 시킨 것이다. 1969년 영화 '여왕폐하의 007'로 제임스 본드가 원상복귀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moore-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4kQrqUD58ivvQd3l2QUghvu8rYAZDc7qlupRdIoNv6erEMfePEUfi6yagyWdaVPQiIeZX3mXSVwglOmo2AuvHtxe7I57uqmqCsQlaiZBhoreR9SqAUPCHFMCt49grzy0i_H-kE7zHAw/s1600/moore-2.jpg)
로저 무어의 본드영화는 '유어 아이스 온리' 이후부터 사실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상처를 입지 않는다. 작은 부상이 전부지 한번 제대로 당해 만신창이가 되는 적이 없다. 나이는 역대 본드들 중에서 가장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제임스 본드를 꼽으라면 단연 로저 무어가 될 것이다.
![[moore-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9q6CWUhIAhDxax-5gVjguaq5uf6aoTqPz80C8BeOuODX3ulV9I_a__9OMr6W-_D8HU2itkOECEQ-2C6ezxjgyGb6UQTuT2qOzPp7NbQEusp26tTGUywgEHUV1gSIFfQQF0GsKb_IpDqw/s1600/moore-3.jpg)
로저 무어는 모두 7개의007 시리즈에 출연했다. 현재로썬 최다기록 보유자다. 아직까지 7편의 007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없다. 이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로저 무어는 또다른 기록을 갖고있다. 바로, 최고령 제임스 본드.
무어가 그의 마지막 본드영화 '뷰투어킬 (1985)'을 찍을 때 만 57세였는데, 아직까지 최고 기록이다. 이 기록 또한 깨지기 힘들 것 같다.
 그 다음 타자는 티모시 달튼(Timothy Dalton).
그 다음 타자는 티모시 달튼(Timothy Dalton).
1944년 3월21일생인 티모시 달튼은 만 42세에 제임스 본드가 됐다. 로저 무어보단 빨리 됐지만 40대에 제임스 본드가 된 건 마찬가지다.
달튼의 첫 번째 본드영화는 1987년작 '리빙 데이라이트'.
이미 42세였으니 코네리, 레젠비만큼 '젊은 본드'는 아니었지만 로저 무어가 57세까지 본드역을 한 덕분인지 티모시 달튼이 중학생처럼 보였다.
티모시 달튼 버전 제임스 본드는 전통적인 007 영화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제임스 본드 캐릭터는 이언 플레밍의 원작 스타일로 되돌려놓았다. '리빙 데이라이트'에는 미사일 나가는 본드카 등 007 영화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티모시 달튼의 제임스 본드는 원작에서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리빙 데이라이트'는 너무 만화처럼 가볍지도 않고 지나치게 딱딱하지도 않은 균형 잘 잡힌 007 영화가 됐다.
![[dalton-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TXfSKZPEtrGsgEnwnzr4Al9k8Ld05HMfrtrIVaCoTek5l_L0xva6zjYo12XCj90cNT7Ly5tImnvWg9-NyQf1C3UBXzBF3qmHwBmJq54GOCB3hh5UBpUQm3x9-U4MY6z1fKkEXZgEv7HY/s1600/dalton-2.jpg)
달튼의 베스트 007 영화는 1989년 영화 '라이센스 투 킬'이다. 이 영화는 다른 007 시리즈와는 달리 본드가 살인면허까지 취소당한다. 귀환명령에 불복하고 친구의 복수에 매달리는 바람에 MI6로부터 'Rogue agent'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쫓기는 신세가 된다. MI6 미션이 아닌 제임스 본드의 개인용무가 줄거리인 007 영화는 '라이센스 투 킬'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본드의 '다크 사이드'가 영화에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MI6에 소속된 정보원이란 뚜렷한 신분이 아닌 오로지 복수에만 전념하는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섹시한 본드걸을 옆에 태우고 미사일 나가는 본드카를 운전해야 제대로 된 제임스 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티모시 달튼이 '라이센스 투 킬'에서 보여준 제임스 본드가 원작에서의 오리지날 제임스 본드에 가깝다. '라이센스 투 킬'이라는 이언 플레밍의 소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언 플레밍의 소설에서 제임스 본드가 튀어나온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티모시 달튼의 제임스 본드는 원작의 것에 가까웠다.
'라이센스 투 킬'이 원작에 가까운 사실적인 스타일의 영화인만큼 제임스 본드도 마찬가지다. '라이센스 투 킬'에서의 제임스 본드는 먼지만 툭툭 털어내던 그런 제임스 본드가 아니다. 제임스 본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치지도 않는 완벽한 캐릭터로 변했다. 그러나, '라이센스 투 킬'에선 제임스 본드가 피를 흘린다. 제임스 본드도 다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dalton-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Bh5354uq9WPI03yrNS5MCJLD1hDsrKPMK-2FdKPdh1dKxtTU-yZSBzzFcGmyLZIjhCDOzwS17NPnjvpwwqcMqgqvqbzAm_nPke94XpxiUfVcpKblyoAVPbxiULg_LUA8MUEhYEV8y7Vc/s1600/dalton-3.jpg)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다. 007 시리즈도 액션영화인데 주인공이 부상당하는 적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본드란 캐릭터가 이렇게도 비현실적인 캐릭터로 변질돼던 것. '라이센스 투 킬'은 제임스 본드도 피를 흘린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적인 캐릭터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본드가 피를 흘리니까 다른 액션영화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인다'고 혹평했다. 사실적인 제임스 본드는 007 답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줄거리까지 본드의 사적인 복수극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라이센스 투 킬'에 실망했던 것 같다.
티모시 달튼은 '라이센스 투 킬'을 끝으로 007 시리즈를 떠났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달튼은 이언 플레밍의 소설대로 45세가 되자 00 에이전트에서 물러났다. 1944년생인 달튼이 1989년 영화를 끝으로 007 시리즈를 떠났으니 딱 들어맞는다.
 6년의 공백기를 지나 본드영화가 돌아왔다.
6년의 공백기를 지나 본드영화가 돌아왔다.
이번엔 1953년 5월13일생의 피어스 브로스난이 제임스 본드다.
그의 첫 번째 본드영화가 1995년작 '골든아이'니까 만 41세에 제임스 본드가 된 셈.
로저 무어 이후 피어스 브로스난까지 '40대 제임스 본드'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새로운 배우로 'Refresh' 된 건 맞지만 40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숀 코네리는 30대 초반, 죠지 레젠비는 29세에 제임스 본드가 됐는데 로저 무어 이후부턴 무조건 40대부터다.
피어스 브로스난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브로스난 버전 제임스 본드를 '로저 무어와 숀 코네리의 중간'이라고 한다. 두 스타일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위기일발'에서 본드와 레드 그랜트와의 격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골든아이'에 나온다. 레이더 타워에서 본드와 알렉 트레빌리안이 한판 붙는 바로 그 장면이다.
![[brosnan-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9Lz8M-QWjJkKv1a3xqV03hZCxuMRlCuKubznElP_KrROLwhh8BPOR0UvMjv0tEVlZA8eSbCEMv_BrBA5e7pehXsB7ZspLf12Pw_HJqrD047hoHa7raq-s5vRut101BJbLArXMKqAfLxI/s1600/brosnan-2.jpg)
브로스난 버전 본드도 대체적으로 '건강한 본드'에 속한다. '골든아이'와 '투모로 네버 다이'에서 얼굴을 다치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다. 브로스난의 영화는 로저 무어의 것처럼 'easy-going'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찔한 위기에 처하거나 만신창이가 되는 적이 없다.
![[brosnan-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6h552MS2668b_H5g0t3bZ9sQCLtB-szV7NGMOwQK7HvPs8Yj9wsTChKEbdx-A3Uh9hPYZ2WS429u6EsMm1hi65OyuRUwL2QaKfVp7XVg9ON-QA4r3hcz-iZNTyqwj-PMC5QEn-KLgEjA/s1600/brosnan-3.jpg)
'The World is Not Enough'에선 어깨를 다치고 '다이 어나더 데이'에선 북한군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머리와 수염을 기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브로스난의 본드영화가 '사실적'이란 단어와 거리가 있다보니 별다른 느낌이 없다.
브로스난은 2002년 영화 '다이 어나더 데이'를 끝으로 50세 문턱에서 살인면허를 반납했다. 로저 무어 이후 계속해서 40대 배우가 제임스 본드를 맡았지만 50대 제임스 본드는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살인면허는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넘어갔다.
살인면허는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넘어갔다.
1968년 3월2일생인 다니엘 크레이그는 만으로 37세에 제임스 본드가 됐다.
조지 레젠비 이후 처음으로 30대 제임스 본드가 탄생한 것이다. 제임스 본드가 30대로 내려온 게 이렇게 오랜만이다.
다니엘 크레이그의 첫 번째 본드영화는 '카지노 로얄'이다. 이언 플레밍의 첫 번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제임스 본드 소설을 영화화 하려면 제임스 본드가 젊어야만 했다. 50을 앞두고 있던 브로스난에겐 이래저래 불가능한 역이었다.
제임스 본드가 젊어진 만큼 영화도 거칠어졌다. 게다가, '카지노 로얄'은 '위기일발', '여왕폐하의 007'과 마찬가지로 원작에 가까운 영화기 때문에 '악세사리'들이 나오지 않는다. '카지노 로얄'의 본드는 총 아니면 맨손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지 화려한 '악세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만에 이언 플레밍 원작의 'Genuine James Bond'로 돌아간 것이다.
![[craig-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S2H-kPRhjkxjoDpasLH_Cd_e1WGvOStSe0jjYZQv9i4jbmi-42E35Ylftp_oKDU6F2yi9njZ42gJp1oegrVr9gOTk7wgtImcJyXcPFV9BZzKbz1GYob8TeuciHiwvHnmXYAERm1kmsK0/s1600/craig-2.jpg)
영화에서의 제임스 본드는 위에서 훑어봤듯이 부상이란 걸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거진 상처를 입지않는 정도다. 하지만, 이언 플레밍의 소설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는 자주 만신창이가 되곤 한다. 고문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밥먹듯 한다. '카지노 로얄'의 제임스 본드는 원작에서의 것과 매우 가깝다. 얻어터지고 피 흘리고 고문도 당한다. 현재까지 나온 007 시리즈 중에서 제임스 본드가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영화가 '카지노 로얄'일 것이다.
![[craig-4.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E6FAw7POmTtA4pYpTywGq3xhRNBMOBXqmNE_Wave4QCzBkUucm6AFolID6oP8mb6gZpWKsHBobA0MHFZUpCH427Z5VPdc00c4AEgEyiLuah-K34cj65BZZB7CxTLtUvCMjv0GBntbYw/s1600/craig-4.jpg)
제임스 본드는 3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티모시 달튼처럼 2개만 찍고 그만둔다면 상관없지만 로저 무어는 50대 후반까지 했고 피어스 브로스난은 다섯 번째 영화를 찍었다면 50대까지 이어질 뻔 했다. 40대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는 감이 있다는 것이다. 007 시리즈가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2~3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40대에 제임스 본드가 되면 나이때문에 끽해야 3~4개가 맥스다. 브로스난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007 제작진은 50대 제임스 본드를 원치 않았던 것 같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카지노 로얄' 하나만 놓고 봤을 땐 훌륭한 선택인 것 같지만 완벽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퍼펙트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알맞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언제까지 제임스 본드를 할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번 제임스 본드도 30대였으면 좋겠다. 힘들게나마 제임스 본드가 제 나이를 찾아 30대로 내려온만큼 앞으로는 계속 30대 배우들이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indy4comiccon1.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Txd0dI7KZ6KqotMdsSfAdg_IMWZymMmdmpHkM2GFJljtOBAbGseQmn9hooj_Pcsk0BNyYP40AM9CAgLjfvAcUADR__VwayicKAqXxqpBvFTvoq43x4IrUH3b5TB7sdgZxdxhyphenhyphenLy-eX4Q/s1600/indy4comiccon1.jpg)
![[indy4comiccon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3aAzI-CJx7RL_S-q-RKjoaE4wAmuvH3RuqA3sIcry7L43ngGmx9Rm-h8VkeNXNNKBJwPYKyj0xslHM3QFdL4G1ZFwsTsgxO1TIlX1BhUdyl69f3ZySBpL8o1u4AaZvKohlixdJb5Oo-Q/s1600/indy4comiccon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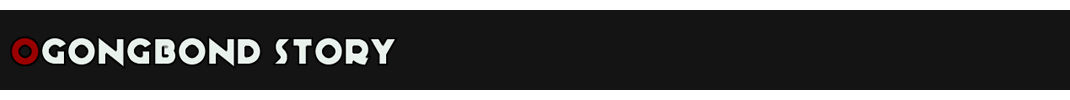

![[connery-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5O9jtjq0uzvVpN8H1Ug6RfCbouGCUxrf10a5f9hCdaBvskj_icdgc46fbySSt_hUPBjgE1rP9bd-j6y-ACRauZXoYafOJk-wYcN7CLFqqUxOTbHoGZcxLMwe1Ccwjov3aQRuDLtTGhCM/s1600/connery-2.jpg)
![[connery-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G-1TdA5Ro_IPkAxmhPVKOYE7NzLvjIEXTOhVAtZ-XmmEe8aPxqWVqr7L93i22cQhaBacEJC08_qDkUMl9KX-eXFLfVhhlQg7MDkxyC7mcKCtv829yx_8PTnig_jdAHT2aL-rhUsFAKBQ/s1600/connery-3.jpg)

![[laz-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6vMPJr2y7PzRXGbomEaCyF6zBYtrLSvKs0gvFa-Rnbj1SYYW_2fX3jeIYUF2SB9U8HtiClv4vXLq8u1Def-GX5XHoWijMt2qGrE7OjFH_wXwpIonqyMTx_I77pirOys3UduhkiyXRb_Y/s1600/laz-2.jpg)
![[laz-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KJG9ao4p92dpGV_xa0AN6sB8WfBoCFk8KqqsPdDJ-cMj4L03L-VyIZo8Dv71_M37SwiY-E-4wmiM-CWIkWrUrUex-O38_C4X3UVHF2pUl-r9bqEdYPTXgMwsUxZ1l0qaHVikH5URi5xQ/s1600/laz-3.jpg)

![[moore-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4kQrqUD58ivvQd3l2QUghvu8rYAZDc7qlupRdIoNv6erEMfePEUfi6yagyWdaVPQiIeZX3mXSVwglOmo2AuvHtxe7I57uqmqCsQlaiZBhoreR9SqAUPCHFMCt49grzy0i_H-kE7zHAw/s1600/moore-2.jpg)
![[moore-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9q6CWUhIAhDxax-5gVjguaq5uf6aoTqPz80C8BeOuODX3ulV9I_a__9OMr6W-_D8HU2itkOECEQ-2C6ezxjgyGb6UQTuT2qOzPp7NbQEusp26tTGUywgEHUV1gSIFfQQF0GsKb_IpDqw/s1600/moore-3.jpg)

![[dalton-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TXfSKZPEtrGsgEnwnzr4Al9k8Ld05HMfrtrIVaCoTek5l_L0xva6zjYo12XCj90cNT7Ly5tImnvWg9-NyQf1C3UBXzBF3qmHwBmJq54GOCB3hh5UBpUQm3x9-U4MY6z1fKkEXZgEv7HY/s1600/dalton-2.jpg)
![[dalton-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Bh5354uq9WPI03yrNS5MCJLD1hDsrKPMK-2FdKPdh1dKxtTU-yZSBzzFcGmyLZIjhCDOzwS17NPnjvpwwqcMqgqvqbzAm_nPke94XpxiUfVcpKblyoAVPbxiULg_LUA8MUEhYEV8y7Vc/s1600/dalton-3.jpg)

![[brosnan-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9Lz8M-QWjJkKv1a3xqV03hZCxuMRlCuKubznElP_KrROLwhh8BPOR0UvMjv0tEVlZA8eSbCEMv_BrBA5e7pehXsB7ZspLf12Pw_HJqrD047hoHa7raq-s5vRut101BJbLArXMKqAfLxI/s1600/brosnan-2.jpg)
![[brosnan-3.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6h552MS2668b_H5g0t3bZ9sQCLtB-szV7NGMOwQK7HvPs8Yj9wsTChKEbdx-A3Uh9hPYZ2WS429u6EsMm1hi65OyuRUwL2QaKfVp7XVg9ON-QA4r3hcz-iZNTyqwj-PMC5QEn-KLgEjA/s1600/brosnan-3.jpg)

![[craig-2.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S2H-kPRhjkxjoDpasLH_Cd_e1WGvOStSe0jjYZQv9i4jbmi-42E35Ylftp_oKDU6F2yi9njZ42gJp1oegrVr9gOTk7wgtImcJyXcPFV9BZzKbz1GYob8TeuciHiwvHnmXYAERm1kmsK0/s1600/craig-2.jpg)
![[craig-4.jpg]](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E6FAw7POmTtA4pYpTywGq3xhRNBMOBXqmNE_Wave4QCzBkUucm6AFolID6oP8mb6gZpWKsHBobA0MHFZUpCH427Z5VPdc00c4AEgEyiLuah-K34cj65BZZB7CxTLtUvCMjv0GBntbYw/s1600/craig-4.jpg)




















 왼쪽부터: Tomkick, Camaro, Solstice, Hummer H2
왼쪽부터: Tomkick, Camaro, Solstice, Hummer H2 Chevy Camero
Chevy Camero Pontiac Solstice
Pontiac Solstice  GMC Tomkick
GMC Tomk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