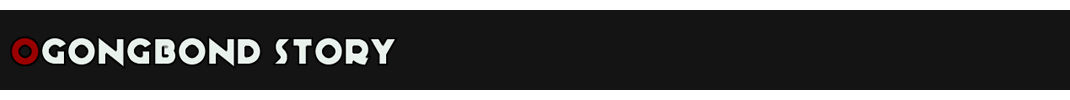그런데, 알고봤더니 '다빈치 코드'보다 먼저 나온 작품이더라.
댄 브라운(Dan Brown)이란 작가를 '다빈치 코드'로 알게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소설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던 덕분이다.
이건 단지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다빈치 코드'를 통해 댄 브라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제목부터 섹시하다 - 'Angels & Demons'.
그래도 '다빈치 코드'를 먼저 읽었기 때문인지 'Angels & Demons'라는 제목이 전혀 촌쓰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빈치 코드'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목의 소설을 서점에서 발견했다면 피식 웃고 지나쳤을 지도 모른다. 'Angels & Demons'가 '다빈치 코드' 성공 이후 뒤늦게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줄거리를 훑어보면 '다빈치 코드'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노인 과학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랭든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면서 사망한 과학자의 딸과 함께 미스테리를 풀어간다는 설정이 '다빈치 코드'와 같기 때문이다.
캐릭터들도 여러 명 겹친다.
살해당하는 과학자 레오나도 베트라는 '다빈치 코드'의 자크 소니에르, 베트라의 딸 비토리아는 자크 소니에르의 손녀 소피 느뵈, CERN의 Director General 맥시밀리언 코흘러는 레이 티빙, 암살자 The Hassasin은 사일라스 등 이름과 역할만 살짝 바꿔친 게 전부인 듯한 캐릭터들이 여럿 눈에 띈다.
한가지 잊어선 안되는 건 'Angels & Demons(2000년작)'가 '다빈치 코드(2003년작)'보다 앞서 나온 책이란 것이다. '다빈치 코드'를 먼저 읽은 사람들에겐 'Angels & Demons'가 '다빈치 코드'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다빈치 코드'가 'Angels & Demons'를 따라했다고 해야 옳다.
댄 브라운의 소설은 요란한 소재와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들이 뒤섞여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스펜스 영화의 스크립트처럼 스피디한 전개의 오락용 어드벤쳐 소설인 게 전부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작품성, 완성도 보다는 오락성 높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가깝다고 해야할 것 같다. 때문에, 줄거리 흐름을 파악하고 넘겨짚는 게 그리 힘들지 않다.
'Angels & Demons' 스토리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준이다. 약간의 미스테리가 섞인 것은 사실이지만 B급 미스테리/호러영화에서 '누가 살인자일까' 추리 같지도 않은 추리를 해보는 식으로 조금만 넘겨짚어보면 작가가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빤히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댄 브라운이 흥행할만한 섹시한 소잿감을 찾는 재주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다빈치 코드'를 보자.
작가 댄 브라운은 초창기 기독교 역사와 기호학 등에 대한 백과사전 수준의 지식을 살인사건 스릴러에 접목시켰다. 소설의 메인플롯인 살인사건의 동기로 사용하기에 아주 섹시한 소잿감을 찾아낸 결과 '다빈치 코드'는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었다. 섹시한 소재가 소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커버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살인사건 미스테리와 로버드 랭든의 어드벤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데도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든 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섹시한 소재 덕분이었으니까.
'Angels & Demons'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안티-캐톨릭 집단 ILLUMINATI를 등장시켜 바티칸과 로마 곳곳에 숨겨진 ILLUMINATI의 비밀 기호들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취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ILLUMINATI가 바티칸을 폭파시키려 한다는 테러계획에 대한 부분은 관심 밖이다. 'Angels & Demons'도 '다빈치 코드'와 마찬가지로 메인플롯인 '사건'과 '어드벤쳐'보다는 '소재'가 전부다시피 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 '다빈치 코드'에 비해 소재가 덜 섹시하다는 것.
'Angels & Demons'에서도 캐톨릭이 어쩌구, 바티칸이 저쩌구 하지만 '다빈치 코드'의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스토리 만큼 섹시하지 않다. 교황이 죽고, 추기경들이 납치되고, 바티칸을 폭파하겠다는 안티-크리스챤 조직이 나올 뿐만 아니라 종교와 과학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주제도 건드렸지만 '예수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만큼 흥미진진하지 않았다.
로마 곳곳에 있는 Bernini의 조각상들을 조사하면서 ILLUMINATI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까지는 흥미진진하지만 재미는 여기까지가 전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니콜라스 케이지(Nicolas Cage) 주연의 어드벤쳐 영화 '내셔널 트레져(National Treasure)' 수준이었다. 바티칸을 겨냥한 테러라는 소재도 알카에다 등 중동 테러리스트들의 테러공격을 소재로 한 스릴러에서 종종 눈에 띄기 때문에 그다지 신선해 보이지 않았다.
'Angels & Demons'도 지루한 줄 모르고 읽을 정도는 됐지만 '다빈치 코드'보다 섹시한 내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화 '내셔널 트레져'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수준이었다. '다빈치 코드'보다 먼저 나온 소설인 만큼 '다빈치 코드보다 못해졌다'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빈치 코드'보다 나은 부분을 한군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곧 영화로 나온다.
WGA 파업이 없었다면 2008년말 개봉 예정이었으나 2009년으로 밀려났다고 한다.
IMDB에 의하면 주인공 로버트 랭든역으론 변함없이 톰 행크스(Tom Hanks), 여주인공 비토리아역으론 '뮌헨(Munich)', '밴티지 포인트(Vantage Point)'로 친숙한 이스라엘 여배우 Ayelet Zurer, Camerlengo Carlo Ventresca로는 '스타워즈(Star Wars)'의 이완 맥그레거(Ewan McGregor)가 캐스팅 됐다.
비토리아역에 Ayelet Zurer?
소설에선 비토리아가 어떻게 묘사돼 있는지 한번 보자:
Lithe and graceful, she was tall with chestnut skin and long black hair that swirled in the backwind of the rotors. Her face was unmistakably Italian-not overly beautiful , but possessing full, earthly features that even at the air currents buffeted her body, her clothes clung, accentuating her slender torso and breasts.
이탈리안과 유대인이 종종 헷갈리는 게 사실인 만큼 이스라엘 여배우가 이탈리안 캐릭터로 캐스팅 된 데 대해 뭐라 할 순 없을 것 같다. 나이가 책에서보다 10년 정도 많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비토리아가 이탈리아 여자인데 라틴계 여배우 중에서 뽑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라틴계 여배우들이 죄다 캐톨릭이라서 '댄 브라운 영화'라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라도 한 걸까?
이완 맥그레거가 Camerlengo로 캐스팅 된 것 역시 약간 의외다.
책에선 Camerlengo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He wore no rosary beads or pendants. No heavy robes. He was dressed in a simple black cassock that seemed to amplify the solidity of his substantial frame. He looked to be in his late thirties, indeed a child by Vatican standards. He had a surprisingly handsome face, a swirl of coarse brown hair, and almost radiant green eyes that shone as if they were somehow fueled by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톰 행크스는 로버트 랭든역에 그런대로 어울리는 것 같다. '다빈치 코드'에서도 랭든역을 연기했으니 행크스를 로버트 랭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로버트 랭든과 비토리아 베트라 콤비로 이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톰 행크스 이외로 론 하워드(감독), Akiva Goldsman(스크린라이터) 등 '다빈치 코드 베테랑'들도 돌아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영화 정보는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Angels & Demons'는 어떤 영화가 될까?
'다빈치 코드'만큼 소재도 섹시하지 않고 '내셔널 트레져'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색다른 스릴러 영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셔널 트레져'보다 약간 진지한 게 전부인 데 그치고 말까?
IMDB에 의하면 영화 'Angels & Demons'는 2009년 5월 개봉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1년 남았다.